술을 먹자던 지인들의 전화에는 ‘아프다’했다. 밥은 먹고 사느냐던 친구들의 문자메시지에는 ‘전화기가 이상하다’했다. ‘랭크 게임’을 같이하자던 팀원들의 스카이프 채팅 요청은 차단했다. 주위에는 모두 방해꾼들 뿐이다. CBT계정을 내놓으라는 친구 녀석도, 로그인만 한 번 해보자던 후배 놈도 모두 그랬다. 마치 절대반지를 가졌던 프로도의 마음이 이랬을까. 검은 사막 CBT가 진행됐던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는 다른 세상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밤 12시에는 테스트가 종료돼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여러가지 의미로 개발사인 ‘펄어비스’와 서비스사인 ‘다음’ 덕분에 이 기사를 마감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
‘검은 사막’CBT는 여러모로 치열했다. 각지에서 난다긴다하는 게이머들이 한데 모여 질펀한 싸움판이 벌어진 형국이었다. 실은 첫 테스트날만 해도 별 차이 없었다. 길드원을 구한다던 사람들이 잔뜩 몰려올 때 까지만 해도 그저 신작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첫 공성전이 진행된 3일차 까지만 해도 실은 그냥 치고 박는 게임이었다. 일부 길드들이 있었지만 이름 위에 태그만 붙었을 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공성전이 시작되자 이 게임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다. 여기 저기서 날아오는 화살에 손도 못쓰고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덩치가 큰 자이언트가 쿵쾅거리며 뛰어오더니 몇 방 치자마자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저 멀리서 휘황찬란한 갑옷을 두른 길드 서너 개가 잔뜩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성문을 여는 순간,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변하고야 말았다. 아 이 게임이다.

사막의 중심에서 ‘살려줘’를 외치다
게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막하기는 처음이다. 광활한 대륙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이 기분은 십수년전 MMORPG를 처음 접할 때 느낌이다. 그간 너무나도 편한 게임에 길들여져 있어서일까. 어쩌면 답답한 기분도 남아 있다. 너무 많은 버튼들을 눌러야 하고 너무 많은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 한 2년동안 Q, W, E, R키를 주로 누르고 숫자키 한두개와 D, F키로만 게임을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처음 받는 인상은 이 게임은 진짜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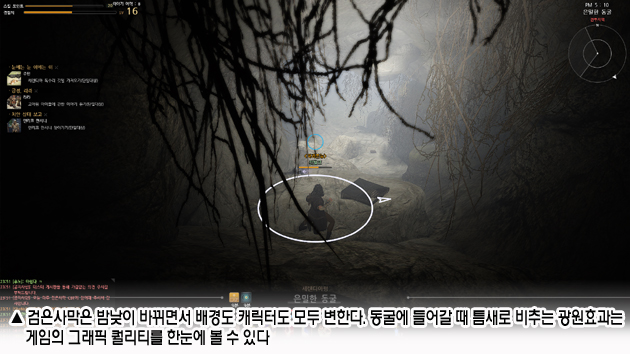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을 받는 게임이 진짜 오랫만이다. ‘블레이드 & 소울’을 할 때 조차 두근거림은 있었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게임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애써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04년쯤 갓 전역을 했던 시기가 생각난다. 조금씩 게임을 하자 오기가 발동된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싶어 게임을 붙잡고 있는다. 다행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에 조금씩 익숙해진다. 하나씩 새로 생기는 스킬들은 몬스터를 때려잡으면서 적응해 나간다.
마차 무역 ‘횡재했네’
조작법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다른 시스템이 눈에 들어온다. 2일차가 지나자 사람들은 돈을 벌기시작했다. 테스터들 사이에서 가장 각광받은 시스템은 바로 무역. 무역시스템은 한 지역에서 물건을 최저가로 구매한 다음 다른 비싼 지역에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 수량이나 판매 수량에 제한이 없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한 제품을 산 다음에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고 이것을 산 자리에서 팔아도 돈은 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무척 쉬운편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어 후반 콘텐츠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였다. 짧은 CBT 기간임을 감안해 난이도를 대폭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썰 것인가 벌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일단 돈에 여유가 생기면서 두 가지 기로를 놓고 고민하게 된다. 일단 집은 필수로 사야 하고, 이후에 돈을 많이 벌어서 탄탄한 기반을 다질지 아니면 PvP로 나서서 썰고 다닐지를 고민해야 했다. 천성이 PvP를 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집을 사고 남은 돈은 모두 장비 강화에 투자했다. 다시 이 장비를 바탕으로 레벨업을 하는 식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공성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 내 손가락이 따라줄 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하고 보는게 중요했다. 때문에 어느정도 돈을 버는 순간부터 장비를 강화했다.

‘리니지’가 연상되는 강화 시스템인데, 무기를 강화할 때 마다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6강까지는 쉽게 올랐고, 그 이후부터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리 많은 돈을 모은 것은 아니어서 전부 테스트하지는 못했지만 총 3개 무기를 테스트해본 결과 6강 이후까지 올리기가 어려웠다.
심장이 두근두근 공성전의 참맛
4일차가 되자 첫 공성전이 시작됐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성벽 위에서 활을 쏘는 사람과 성벽 아래에서의 전투로만 보였다. 일부 길드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위용을 떨친다고 보기에는 애매했다. 7일차가 되면서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벌써부터 최고 레벨을 찍은 바다 길드나 파괴본능 길드 등 눈에 띄는 몇몇 길드들이 대치하는 형국이 인상적이다.

특히 바다길드 연합이 뒤에서 밀고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성문을 뚫는 장면은 CBT최고의 하일라이트였다. 과거 ‘다크에이지 오브 카멜롯’의 공성전을 연상케 한다. 최종보스인 공성수호자를 물리치자 성은 아군의 진영 소유로 돌아갔다. 물론 이후에 다시 한번 뺏기기는 했지만 한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임이었다.
진짜 PvP게임이 온다
7일간의 CBT를 경험해본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짜 PvP게임이 등장했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직 완성된 게임은 아니지만 향후 기대 가치가 무척 크다. 그간 수 많은 스타 개발자들의 기대작이 등장했고, 그 만큼이나 빠르게 많은 타이틀들이 무너진 가운데 ‘이번에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다. 근래 플레이한 게임 중에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한가지 단점이라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 워낙 디테일한 콘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보다 한단계 높은 진입장벽이 예상된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과거 게임을 즐기면서 충분한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라면 한 단계 발전한 캐릭터 콘트롤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몇차례 테스트를 더 거치면서 발전할 ‘검은 사막’의 미래에 걸어 보고자 한다.
